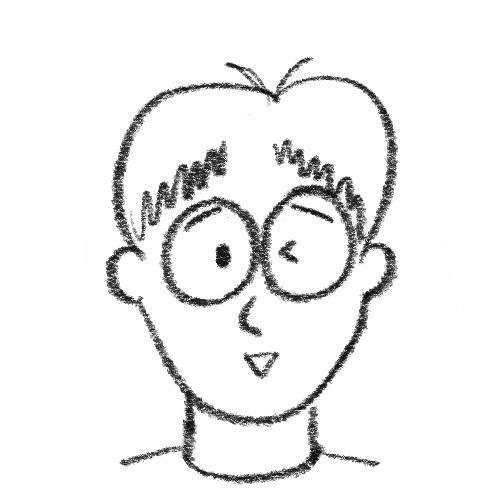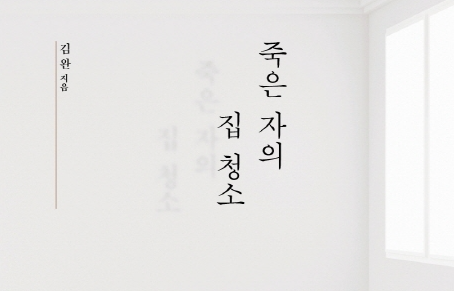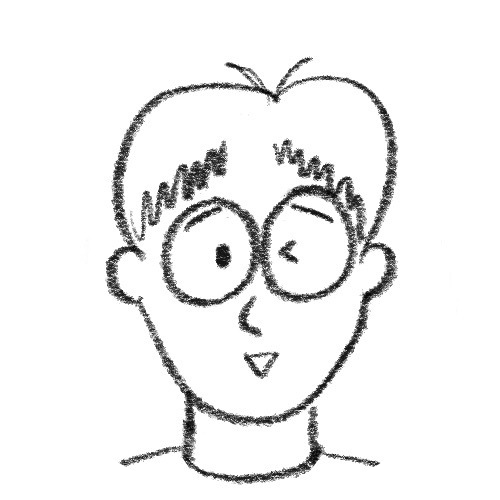죽은자의 집청소(김완 지음)를 읽고…
- 형은 항상 현대 과학과 메마른(?)인간애로 버무러진 나를 구하기 위해 이런 책들을 추천해주곤 한다.
- 덕분에 적어도 주말에는 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할지 조금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기억에 남는 부분
이 책의 저자는 대학 시절 시(Poet)를 전공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신선한 문구와 표현들에 감탄하곤 했다. 그냥 지나치긴 아까워서 몇 자 기록해놓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봐야겠다.
- ‘꽃’ 좋은 곳에서 영원히…
문밖에 있던 꽃다발을 이제는 완전히 텅 빈 지하 주택의 창가로 옮긴다. 이 창가라면 오후 한때나마 해가 머물다 갈 것이다. 여기에선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과 먹이를 구하러 바비 길 건너는 고양이처럼, 쉼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작은 부분일지언정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다.
내가 집을 정리하기 위해 머무는 내일까지라도 어두운 계단 구석 말고 부디 여기 해와 달이 비치는 창가로 와서 당신의 친구들이 바친 아름다운 꽃 향기라도 맡고 가시라.
그리고 부디 꽃 좋은 곳에서 영원히…
- 어떻게 이런 세련된 비유를 사용할 수 있을까?
언뜻 보기엔 부촌의 언덕배기에 새로 지어올린 전형적인 고급 빌라다. 건물 현관에 청소와 소독 장비를 내리고 뒤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돌아가자 여기저기 금이 간 붉은 벽돌과 군데군데 바스러진 시멘트로 마감한 낡은 벽면이 드러난다.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전면부를 갈아내고 실내마저 새것으로 바꿨지만, 어째서인지 건물의 뒤쪽까지는 손보지 않았다. 흡사 청년의 가면을 쓰고 턱시도까지 차려입은 노인이 굽은 허리를 짐짓 꼿꼿이 세운 채 안간힘을 쓰며 활보하는 핼러윈의 뒤안길처럼 쓸쓸하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면, 쓰레기가 극도로 쌓인 집엔 동전과 지폐가 아무 곳에나 흩어져 이리저리 나뒹군다는 점이다. 꽤 오랫동안 이런 집을 맡아왔지만 예외 사례를 찾기가 더 힘들다. 돈이 음식물에 뒤섞여 방바닥에 잔뜩 흩어져 있고 책상 위나 싱크대 위, 화장실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 에넘느레하게 널브러져 있다. 심지어 탕수육 소스가 담긴 그릇이나 변기 안에서 동전을 끄집어낸 적도 있다. 마침 지진이라도 일어나 그대로 매몰되면 현행 화폐가 걸쭉한 전분 소스에 코팅되어 또렷하게 보존된 화석으로 발견될지도 모른다.
돈과 쓰레기의 구별, 즉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가 허물어져 자본주의적 특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 상황. 쓰레기를 모으는 이야말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청빈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군자인지도 모른다.
이런 저런 생각들
- 사람은 아는 만큼 글을 쓰는 것 같다. 자연스럽게 묻어나온달까?
- 개발 문서도 이렇게 즐겁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다. 불가능할 것을 알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은가.
- 이 일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여러 질문을 꺼내는 작가, 결국 그 질문들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인상깊었다. 작가님 만큼은 아니겠지만,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황을 이해하려 이리저리 배회하다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잘 알게 되곤 했던 것 같다.